회원님은 현재 PC 에서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 하셨습니다.
원활하게 이용을 하시려면 PC 버전으로 접속 하시기 바랍니다.
www.artnstudy.com
| |||
|
그동안 대중과 함께하는 문학 읽기를 꾸준히 진행해 온 김진영 선생의 또 다른 문학 여정이 시작되었다. 여덟 개의 주제를 놓고 여덟 편의 작품을 읽어 나가는 여정을 함께할 길동무들에게 그가 전하는 프롤로그를 들어보자.
"오랫동안 소설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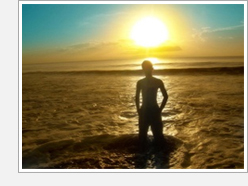 그 사이에 소설들은 자꾸만 얼굴을 바꾸었다. 사춘기 시절 소설은 뗏목이었다. 대책 없이 어디론가 떠내려가게 만드는. 젊은 시절 소설은 미지의 여인이었다. 프루스트가 그랬듯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해 버린 어떤 여인. 나이 들고 환상 대신 환멸을 배우게 되었어도 소설 읽기를 그만두지는 않았다. 소설도 얼굴 바꾸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때 소설은 카산드라의 운명이었다. 진실을 외치는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고독하고 참담한 예언. 또 어느 때 소설은 고르곤의 눈이었다. 결코 마주 볼 수 없는 그러나 언제나 정면으로 응시하는 어떤 시선. 또 어느 때 소설은 화이트 노이즈였다. 사실은 들리지 않는 그러나 달팽이관 속의 무슨 벌레처럼 끊임없이 사각거리는 소리. 또 어느 때 소설은 심지어 신처럼 여겨졌다. 없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마저 없으면 안 되므로 있어야 하는 어떤 것.
그 사이에 소설들은 자꾸만 얼굴을 바꾸었다. 사춘기 시절 소설은 뗏목이었다. 대책 없이 어디론가 떠내려가게 만드는. 젊은 시절 소설은 미지의 여인이었다. 프루스트가 그랬듯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해 버린 어떤 여인. 나이 들고 환상 대신 환멸을 배우게 되었어도 소설 읽기를 그만두지는 않았다. 소설도 얼굴 바꾸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때 소설은 카산드라의 운명이었다. 진실을 외치는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고독하고 참담한 예언. 또 어느 때 소설은 고르곤의 눈이었다. 결코 마주 볼 수 없는 그러나 언제나 정면으로 응시하는 어떤 시선. 또 어느 때 소설은 화이트 노이즈였다. 사실은 들리지 않는 그러나 달팽이관 속의 무슨 벌레처럼 끊임없이 사각거리는 소리. 또 어느 때 소설은 심지어 신처럼 여겨졌다. 없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마저 없으면 안 되므로 있어야 하는 어떤 것.
그러고 보니 궁금하다.
소설들은, 봉인된 혀들은, 도대체 어던 꿈들을 꾸는 걸까."
여덟 편의 소설 속에서 봉인이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필립 로스의『울분』과 함께 청춘의 의미를,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함께 기다림의 의미를,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과 함께 고독을, 가와바다 야스나리의『잠자는 미녀』와 함께 죽음을, 조셉 콘래드의『암흑의 핵심』과 함께 악의 문제를, 가브리엘 마르케스의『예고된 죽음의 연대기』와 함께 폭력의 문제를, 오노레 드 발자크의『사라진느』와 함께 거세의 문제를, 모니카 마론의『슬픈 짐승』과 함께 시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읽어본다.

김진영(인문학자, 철학아카데미 대표)
고려대 대학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University of Freiburg)에서 아도르노와 벤야민, 미학을 전공하였다. 바르트, 카프카, 푸르스트, 벤야민, 아도르노 등을 넘나들며, 문학과 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생각을 바꿔주는 강의’, '인문학을 통해 수강생과 호흡하고 감동을 이끌어 내는 현장', ‘재미있는 인문학의 정수’라 극찬 받았다. 또한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독서 강좌로도 지속적인 호평을 받았다. 현재 홍익대, 중앙대, 서울예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사)철학아카데미의 대표를 지냈다.